단감 아닌 떫은 감
철길 따라 자리 잡은 마을 중간에 너른 마당과 과실수를 가진 집이 있었다. 과실수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제법 당도 높은 아름드리 큰 단감나무다. 물론 그 좌우로 몇 그루 그다지 관심 받지 못하는 떫은 감나무도 있었다. 먹 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가을이 되면 그 집 단감나무는 마을 아이들의 서리 표적이 되었다. 이래저래 얻을 게 없었던지 그 집 주인 아저씨는 단감나무 주위에다 철조망을 둘렀다. 물론 서리만을 통해서 그 집 단감을 먹는 건 아니 었다. 가끔 아저씨가 끝을 가른 장대를 들고서 감을 딸 때 그곳을 지나게 되면 굳이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크게 했다. 아저씨는 하나를 주기도 하고 여럿 달린 가지를 넘겨주기도 했다. 겉옷에다 쓱쓱 닦고서 한 입 베어 물면 처음에 조금 떫긴 해도 계속 씹다보면 그렇게 단맛이 날 수가 없다.
감이 익을 무렵이 되었는데 나무 아래 아무도 없으면 골목길로 드나드는 길이 서운했다. 그때는 지금 같은 시멘트나 철망 담장이 아니었다. 수숫대이거나 판자 나무거나 잘하면 대나무였다. 물론 돌담도 있었고, 좀 산다는 집은 시멘트 담장을 두르기도 했다. 수숫대나 대나무 울타리는 손이 많이 갔다. 명절이 돌아오면 삭은 것을 뽑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연례행사였다. 촘촘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었다. 우리는 다 알았다. 얼기설기한 곳으로 들여다보면 밥을 먹고 있는지, 명절 쇠러 누가 찾아 왔는지, 감을 따는지, 홑이불을 빨아 널었는지, 재잘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.
감나무 있는 집이 흔하지 않았다. 단감나무는 더 귀했다. 그러니 가을 초입에 홀대 받던 떫은 감도 나중 소금에 절여서 떫은맛을 뺀 다음 먹거나, 그도 아니면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홍시를 만들어 먹었다. 그렇다보니 단감은 우리 차지엔 언감생심이다. 오히려 떫은 감이 나중 더 귀하신 몸(?)이 되었다. 한 겨울,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라 장독대 안에다 고이 보관해둔 홍시를 저녁식사 후에 꺼내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. 그래서 지금도 다들 반시 상태로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 여름까지 홍시를 먹기도 한다. 그때 그 맛을 추억해서다. 추석연휴를 보내고 있다. 눈에 좋게 보이거나, 맛이 좋다고 선뜻 모든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. 단감 아닌, 떫은 감이라도 지나고 보면 오랜 동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. 조금씩 깊어 가는 가을, 신앙인으 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산다면 그럼 된 것이다.
- 구암동산 하늘문지기 허영진 목사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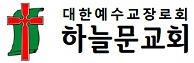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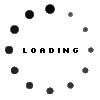
댓글0개